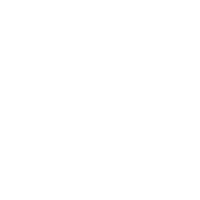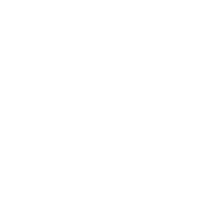송호근 지음 <나는 시민인가>
1985년 11월 14일 동남아 바다, 부산으로 귀항하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광명 87호에 ‘SOS’가 수신되었다. 잠시 후 10여 명의 사람들이 갑판 위에 힘없이 버티고 있는 조그만 목선을 발견했다. 목선은 엔진이 고장 나 표류 중이었다. 이른바 공산화된 베트남을 피해 배를 타고 탈출한 ‘보트피플’이었다. 그들은 광명 87호를 향해 간절하게 손을 흔들어댔다.
전재용 선장은 본사에 상황을 타전했다. ‘관여하지 말라’는 회신이 들어왔다. 목선을 외면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전재용은 선장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 간부 선원들을 불러모아 구조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찬반이 엇갈렸다. 전재용 선장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며 구조를 지시했다. 10여 명일 줄 알았던 목선에는 갑판 아래 남녀노소 수십 명이 뒤엉켜 있었다. 임산부를 포함해 모두 96명이나 됐다. 이전에 25척의 배들이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해 지나쳤다고 했다.
선장실은 치료실로, 선원실은 그들의 방으로 내줬다. 부산 도착 때까지 맞춰 실은 선원들의 식량과 식수를 쪼개 근근이 버텼다. 식량이 바닥나자 전 선장은 “잡은 참치가 가득 있다”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결국 96명의 보트피플은 부산에 안착해 목숨을 구했는데, 전재용 선장은 항구에 내리자마자 해고통지서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가 멍게잡이를 시작했다.
2009년 5월의 홍콩, 신종플루 방역에 전쟁을 치르던 사이 시내 한 호텔에 투숙 중인 멕시코인이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콩 당국은 즉시 투숙객 300여 명이 있는 호텔을 일주일 동안 봉쇄했다. 봉쇄 당시 시내에 있던 외국인 투숙객들 모두 자진해서 호텔감옥(?)으로 돌아왔는데 유독 한국인 3명이 이를 거부했다. 끝내 한국 영사관의 협조를 얻어 이들을 격리시킬 수 있었다. 전염병 방역체계의 밑바닥이 ‘격리’이건만 공익을 우선시 하는 시민의식이 나라 사이에 극명하게 비교됐다.
2015년 5월의 한국, 메르스 바이러스 초기 방역에 실패해 온 나라가 방역 전쟁 중이다. 와중에 중국을 거쳐 다시 홍콩으로 간 감염자가 생겼다. 깜짝 놀란 홍콩 정부의 비상 대처 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한국인 여성 2명이 한때 격리를 거부하면서 6년 전의 ‘한국인 시민의식 실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와중에 서울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일행 10여 명과 버스를 타고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 골프를 즐기다 발각돼 전 국민의 입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시민의식’의 완벽한 실종이다. 30년 전에는 국제적 칭송까지 한 몸에 받았던 ‘대한 시민 전재용’이었는데 말이다.
사회학자 송호근이 “시민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자기 자신은 그런 기준에 맞춰볼 때 감히 ‘나는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성찰한 지식서이다. 결론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되 타협할 줄 알고, 공익에 긴장하는 시민정신’을 회복하자는 주장과 설득을 담았다.
저자에 따르면 ‘국민적 단결’ 아래 시작된 새마을 운동과 경제 기적에 정신이 팔려 앞뒤 재지 않고 달리는 사이 우리가 소홀히 한 것, 희생시킨 것이 바로 ‘시민의식’이다. 서양에서 거의 100여 년이 걸렸던 시민사회 형성의 경험지층을 빼먹고 건너 뛴 것이다. 경제는 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사회는 단축과 생략이 불가능함을 잊었던, 몰랐던 것이다. 이 시민사회의 토대는 ‘자율성’이다.
시민사회의 부재는 공유코드의 부재를 부른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리기에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없다. 정치와 사회에 극단적 충돌이 계속되는 이유다. 공유코드가 없다 보니 사람 간의 사소한 분쟁도 여차하면 ‘법대로’이다. 민사소송이 일본의 10배에 달하고, 법 집행의 원리를 담당할 대법관이 1년간 판결하는 소송 건수가 1,800여 건에 달한다. 평소 법을 존중하는 법치주의는 경시하되, 법 이전에 작동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서로 간에 해결할 능력들이 안 되기에 이렇다.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민은 누구일까. 핵심은 ‘시민참여, 시민권, 시민윤리’ 이렇게 3가지다. ‘참여’는 시민단체 활동이다. 유럽은 시민 한 사람당 평균 2~3개의 단체에 참여한다. 계층, 학력, 직업, 재산, 성별, 연령 등을 떠나 ‘계급장 떼고’ 벌이는 자발적 토론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싹튼다. 사익과 공익의 구분이 분명해진다. 그렇게 형성된 시민의식은 정치권도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권리’는 일방적으로 누리기보다 타인과 사회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먼저 의식하는 균형에 가치가 있다. ‘윤리’가 바로 공익을 무시하지 않는 긴장, 타인에 대한 배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것, 공동체적 헌신에 해당하는 가치인데,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시민윤리가 전제되지 않고는 있는 사람들(강자, 갑)의 ‘양보’와 없는 사람들(약자, 을)의 ‘헌신’이 짝을 이룰 수 없다. 이른바 ‘국민대통합’이 어렵게 된다.
두꺼운 책을 짧게 요약하다 보니 동원된 단어들이 전에 없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책을 처음부터 찬찬히 읽게 되면 이해하는데 그리 어려운 문장이나 낱말은 없으니 어려운 책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컬럼니스트 최보기 thebex@hanmail.net
'뉴스 > 전문필진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학작품으로 읽는 인천항 풍경] 7화 비누공장과 김상민의 '안해' (3) | 2015.07.07 |
|---|---|
| [칼럼] 초대형 유조선 시황 유동적 (0) | 2015.06.30 |
| [문학작품으로 읽는 인천항 풍경] 6화 사이다 병, 임화의 '야행차 속' (3) | 2015.06.16 |
| [칼럼] 시장점유율 경쟁과 해운서비스 경쟁 (3) | 2015.05.29 |
| 인천항만공사 최보기의 책보기 06 - 뜻밖의 한국사 (3) | 201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