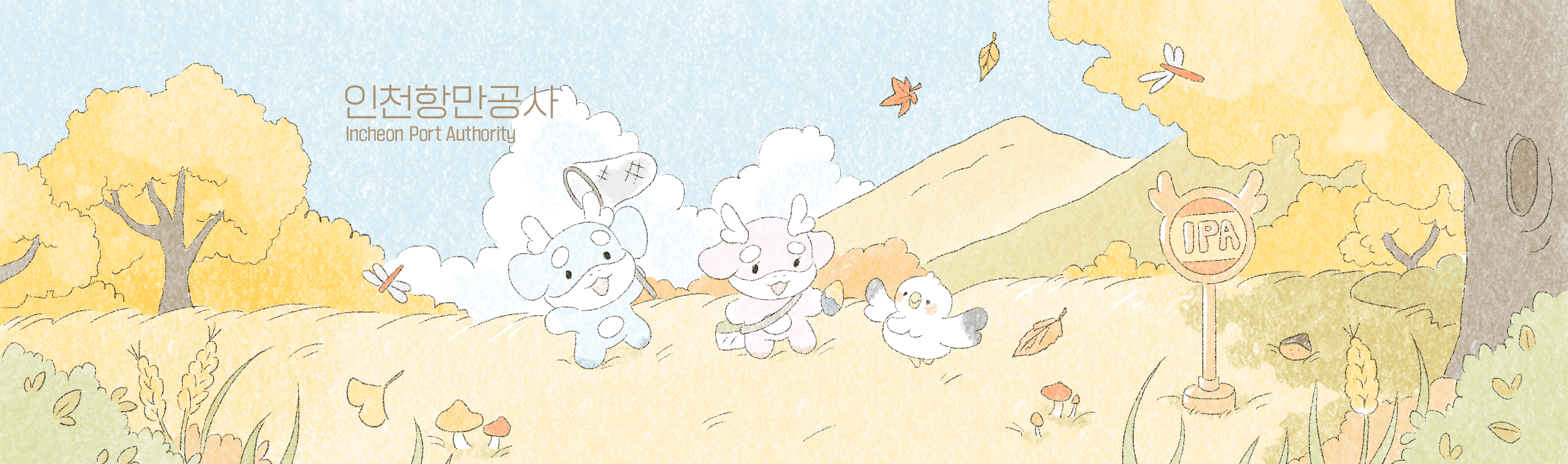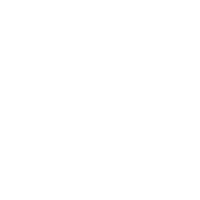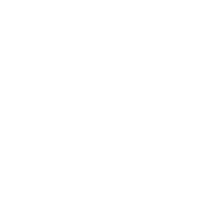문학작품으로 읽는 인천항 풍경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시대의 협량함에 주박된 운명을 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카프 중앙위원회 서기장이고 좌파 진영의 대표적 문학이론가이자 시인이었던 임화의 시를 읽어볼 텐데요. 일찍이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모던 보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미남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인이자 평론가, 문학운동가인 임화의 시 '야행차 속' 으로 떠나 볼까요?
夜行車(야행차) 속
사투리는 매우 알아듣기 어렵다.
하지만 젓가락으로 밥을 나러가는 어색한 모양은
그 까만 얼골과 더불어 몹시 낯닉다.
너는 내 方法(방법)으로 내어버린 벤또를 먹는구나.
"젓갈이나 거더 가주 올게지......"
혀를 차는 네 늙은 아버지는
자리가 없어 일어선 채 부채질을 한다.
글세 옆에 앉은 잔잔한 사람이 수건으로 코를 막는구나.
아직 멀었는가 秋風嶺(추풍령)은......
그믐밤이라 停車場(정차장) 標(표)말도 안보인다.
답답워라 山(산)인지 들인지 대체 지금 어디를 지내는지?
나으리들 뿐이라, 누구한테 엄두를 내어
물을 수도 없구나.
다시 한번 손목시계를 드러다보고 洋服(양복)장이는 모를 말을 지저귄다.
아마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아나 보다.
되놈의 땅으로 농사가는줄을 누가 모르나.
面所(면소)에서 준 표紙(지)를 보지. 하도 지척도 안뵈니까 그렇지!
車(차)가 덜컹소리를 치며 엉덩방아를 찧는다.
필연코 어제 아이들이 돌멩이를 놓고 달아난게다.
가뜨기나 무거운 짐에 니 그 사이다 병은 집어넣고 무얼할 래
오호 착해라. 그래도 누이 시집갈 제 기름병을 할라고......
怒(노)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는 소 같구나.
빠가! 잠결에 기대인 늙은이의 머리를 밀처도.
엄마도 아빠도 말이 없고 허리만 굽히니......
오오, 물소리가 들린다. 넓고 긴 洛東江(낙동강)에......
대체 어디를 가야 이밤이 샐가?
얘들아, 서있는 네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니?
車(차)는 한창 江(강)가를 달리는지,
물소리가 몹시 情(정)다웁다.
필연코 故鄕(고향)의 강물은 이 꼴을 보고 怒(노)했을게다.
임화(1908~1953)의 야행차는 유이민 시의 유형에 속합니다. 경상도에서 만주로 떠나는 일가를 기차안에서 만난 화자가 그 가족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유이민의 삶은 마치 처음 가 보는 길을 '밤'에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함이 업슴하는데 도착한 곳에서도 미래는 보이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유이민들의 삶,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농민들의 삶이었다는 것이 당시의 비극인 것이지요.
1930년대 인천항에 정박한 일본화물선 = 사진제공 : 인천항만공사
임화의 야행차 속 에는 '사이다 병'이라는 시어가 나옵니다. 한때 유명한 민담가의 "인천의 앞바다에 사이다가 떳어도 곱뿌가 없으면 못 마셔요"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요. 이 말이 그냥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량음료의 시발은 1905년 인천탄산수제조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별표사이다'가 생산되었고, 광복 후 '스타사이다'를 거쳐 '칠성사이다'에 흡수되었습니다. '사이다병'을 만드는 유리 역시 1905년 송월동에 유리공장이 설립되었고, 1928년 만석동에 인천유리제조소가 개업하면서 약병, 과자병, 어향 등의 유리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은 근대 산물의 집결지이자, 생산지 역할을 했습니다.
'콘텐츠 > 전문필진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칼럼] 초대형 유조선 시황 유동적 (0) | 2015.06.30 |
|---|---|
| 인천항만공사 최보기의 책보기 07 - 나는 시민인가 (0) | 2015.06.23 |
| [칼럼] 시장점유율 경쟁과 해운서비스 경쟁 (3) | 2015.05.29 |
| 인천항만공사 최보기의 책보기 06 - 뜻밖의 한국사 (3) | 2015.05.28 |
| [문학작품으로 읽는 인천항 풍경] 5화 인천에 대한 아련한 추억, 조병화의 '추억' (4) |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