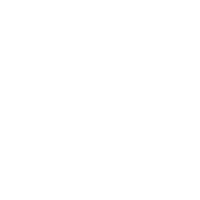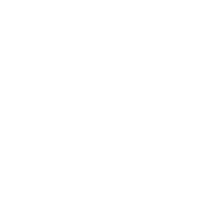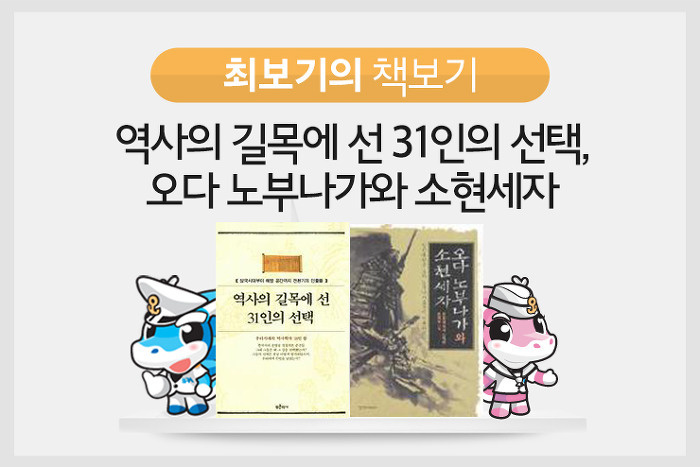시카고 대학의 저력은 인문고전 100권
김경집 지음ㅣ학교도서관저널 펴냄.
<고전, 어떻게 읽을까?>
인천항만공사 웹진의 주요 구독 연령대에는 청소년, 청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어떤 책에 대해 가급적 중복 소개를 피하고 있지만 인문학자 김경집의 <고전, 어떻게 읽을까?>는 최근의 신간 중 청소년, 청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책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읽어도 충분히 좋은 책이기에 굳이 소개하기로 했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인터넷에 ‘시카고 플랜’ 또는 ‘더 그레이트 북 프로그램(The great book program)’을 검색해보면 아래의 내용이 지천에 널려있다. 1890년 대부호 록펠러가 중북부 시카고에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지만 1929년까지 이 학교는 그저 그런 학교였다. 서른의 젊은 나이에 총장이 된 로버트 허친스는 야심차게 시카고 플랜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재학 동안 인문고전 100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 제도였다. 대공황과 겹친 취업난에 고전이 무슨 도움이 되냐며 교수와 학생들의 저항이 컸지만 허친스 총장은 밀어부쳤다. 그 결과 지난 2000년까지 이 학교는 무려 6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
<엄마 인문학>의 저자인 인문학자 김경집이 펴낸 <고전, 어떻게 읽을까?>는 이 시카고 플랜부터 서두에서 언급함으로써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들이 읽으면 좋을 동서양의 인문고전 필독서 29권을 ‘엄선’해 책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 책에도 포함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대화’라고 정의했다. 그것은 고전도 마찬가지다. 천년 고전을 21세기에 호출, 현재의 상황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고전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냥 좋은 책들을 읽으면 되지 남이 읽기를 안내하는 글을 읽는 건 시간낭비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런 독서 길라잡이 책이나 서평집이 실속 있는 독서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다. 첫째, 특정 책이 갖는 메시지를 ‘프로’가 핵심적으로 정리했기에 읽는 순간 그 책에 대한 독서욕구가 높아진다. 둘째, 특정한 책을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읽으면 좋을지 미리 안내를 받았기에 이해도가 높아진다. 셋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독서의 집중력 또한 높아진다. 넷째, 이렇게 책을 읽고 나면 그 책에 대한 독자적인 정리가 쉽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기억으로 저장됨으로써 세상물정을 인식하는 스펙트럼이 확실하게 넓어진다.
저자가 엄선한 고전들은 세익스피어 <햄릿>, 애덤 스미스 <국부론>, 공자 <논어>, 일연 <삼국유사>, 샐린저 <호밀밭의 파수꾼>,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최인훈 <광장>, 박경리 <토지>, 루쉰 <아Q정전>, 루소 <에밀> 등이다. 명색이 불멸의 인문고전이라면 대부분 서양의 고전 일색일 줄 예단했던 필자로서는 <춘향전>까지 우리 고전이 6권이나 포함된 것을 보고 ‘역시 인문학을 전공한 학자는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실 홍길동, 전우치, 이몽룡(춘향전)을 합하면 서양인들이 최고의 고전으로 찬미하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모험과 복수의 맥락이 유사하지 않은가 말이다. 이 책에는 당연히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도 포함돼있다.
필자는 그 동안 역사가도 아닌 일연 스님이 자기 멋대로 지어낸 소설에 불과할 것이라며 <삼국유사>를 은근히 무시했다. 그런데 저자는 <삼국유사>가 ‘스토리 텔링의 보고’라고 극찬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스치듯 등장하는 ‘장금’이란 이름 두 자에 상상력이 보태지자 한류 드라마 ‘대장금’이 탄생했듯이 <삼국유사>에는 그런 스토리들이 널려있다고 한다. 육당 최남선은 아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서슴지 않고 후자를 고를 것”이라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서양동화에 익숙한 필자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작품이 그리스 등 유럽에서 유래한 것으로만 알았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신라 경문왕 편에 똑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권력자의 치부를 감추려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경문왕 역시 왕위 계승의 정통 적자가 아니라는 불안이나 열등감이 이 이야기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어떤 독자든 책꽂이에 꽂혀있더라도 그냥 방치했을 <삼국유사>에 대해 ‘어? 그래?’하는 마음과 독서욕구가 솟아나지 않을까?
'콘텐츠 > 전문필진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보기의 책보기] 24 - 역사의 길목에 선 31인의 선택, 오다 노부나가와 소현세자 (0) | 2016.11.16 |
|---|---|
| [칼럼] Cheer up! Soft Power of Incheon Port (0) | 2016.10.26 |
| [칼럼]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0) | 2016.09.29 |
| [최보기의 책보기] 22 - 이야기 자본의 힘 (0) | 2016.09.19 |
| [칼럼] 인천항 발전을 위한 7가지 제언 (1) | 201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