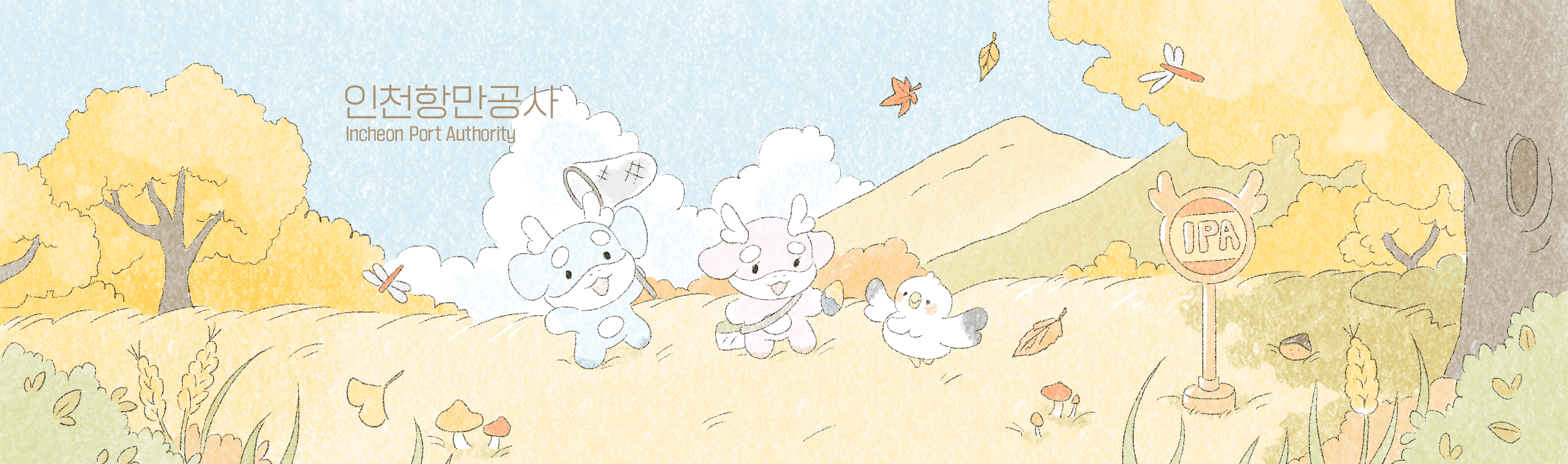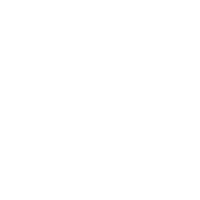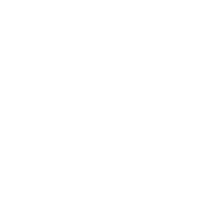임진왜란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동아시아 오백 년 사
김시덕 지음. 메디치 펴냄.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일본 열도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지러운 전후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려 통치기반을 확립하려고 조선과 전쟁을 일으킨 것이 1592년의 임진왜란이었다. 이때 일본은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니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더구나 열도 통일전쟁을 갓 치른 후 전쟁의 기술이 극에 달한 일본군 앞에 부산의 동래산성이 힘 없이 무너지자 조선의 왕 선조는 명나라 코 앞 의주로 피신했다. 이는 여차하면 조선을 버리고 명나라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도였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순리에 따라 일본과의 완충지대였던 조선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명나라는 원군을 파견했다. 조명연합군이 왜군과 맞서던 이 시기 중국 북쪽 만주에서는 여진족 족장 중 한 명인 누르하치가 청나라 건국의 기반을 다지며 서서히 힘을 기르고 있었다.
역사가들은 16세기 말에 벌어진 이 전쟁을 해양세력 일본의 대륙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동아시아 국제 전쟁이었다고 해석한다. 전쟁 전 조선의 내부 실정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던 일본군의 ‘국제 작전계획’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등장한 것이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이었다.
대륙정복이라는 일본의 꿈은 남해안 최후의 거점이었던 명량(진도 울돌목)에서 13척의 함정으로 그 열 배인 130여 척의 일본 함정을 격파한 이순신에 막혀 좌절해야 했다. 한반도 남해안과 일본 열도 동부 해안선을 단순 비교해도 이순신 장군은 최소 10배의 해군력과 맞선 셈이었다. 공식 기록만 ‘23전 23승’에 빛나는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역량이 대륙과 해양이 맞붙은 16세기 동아시아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마침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한 일본은 또다시 유럽의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킨다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명문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침략을 감행했다. 그러나 대륙정복이라는 일본의 야심은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 대신 미국의 ‘핵폭탄’에 의해 쓴맛을 봐야 했다.
21세기 초입인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반도 주변의 열강인 러시아와 중국 대 일본과 미국이 어우러져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남한 내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놓고 어떤 선택이 국익과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지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사태를 두고 일본 및 동남아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벌이며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과 전통적 해양세력인 미국, 일본의 대결로 해석하기도 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든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우리의 의지나 의사와 상관 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전쟁이라는 재앙을 막고 국익과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단합과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 현명한 선택에 대한 답이 과거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조선의 못난 개항>을 읽어봐야 할 까닭이다.
김시덕의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는 앞에서 서술한 16세기 임진왜란부터 20세기 태평양 전쟁까지 500년 동안 한반도와 일본,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국제적 대결의 역사를 조망했다.
‘현재 한반도의 독립과 번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국가를 굳이 들자면, 일본이 아닌 중국이다. 지금의 상황을 120년 전 구한말의 역사와 동일한 전개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어느 시기의 역사와 유사하냐보다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한 나라에 군사, 정치, 경제 등 모든 부문을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다. 유라시아 동해안의 국제적 동향을 무시하고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영향권에 편입돼 살 것인가, 아니면 유라시아 동부의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자리한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복잡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힘들지만 자립되고 번영하는 세력으로 존재할 것인가,의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 저자 김시덕의 기본적인 역사인식이다.
문소영의 <조선의 못난 개항>은 19세기 비슷한 시기에 개항을 했는데도 일본은 성공했고, 조선은 실패했던 원인을 집중적으로 탐사했다. ‘일본은 1853년 미국 페리 함대의 강요로 개항했다. 조선은 23년 후인 1876년 일본의 강요에 의해 개항했다. 그리고 34년 후인 1910년 일본의 공식적인 식민지로 전락했다. 조선이 비록 개항에서 23년 늦었지만 개항 이후 34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리석은) 허송세월로 일관하다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 저자 문소영의 진단이다. 저자는 ‘고종이 즉위한 1863년부터 1910년 한일병탄에 이르기까지 47년 동안 조선은 서양의 근대적 문물을 (잘) 받아들여 나라를 근대화하고 서양식의 부국강병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한다.
'콘텐츠 > 전문필진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보기의 책보기] 22 - 이야기 자본의 힘 (0) | 2016.09.19 |
|---|---|
| [칼럼] 인천항 발전을 위한 7가지 제언 (1) | 2016.08.29 |
| [칼럼]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시대를 준비하자 (0) | 2016.07.28 |
| [최보기의 책보기] 20 - 지지 않는 대화 (0) | 2016.07.20 |
| [칼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관문 (0) | 2016.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