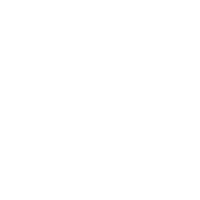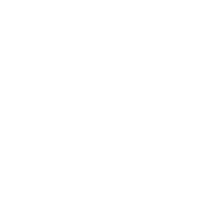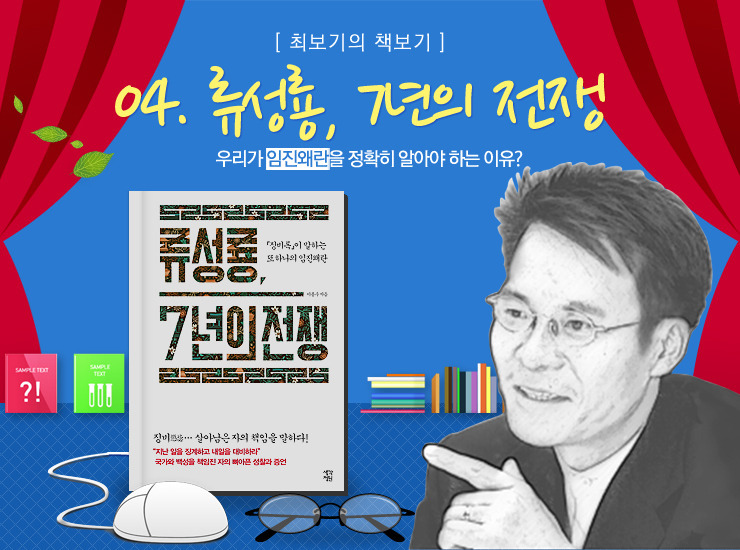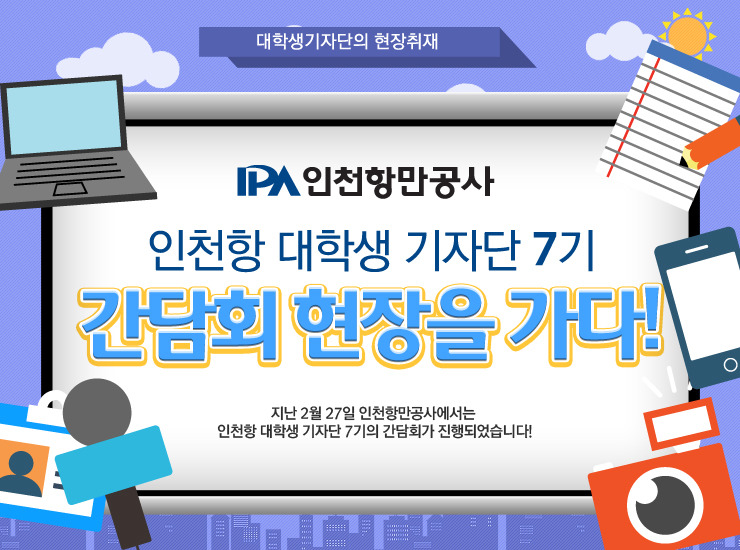박상익 지음 <나의 서양사 편력 1·2>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 오랜만에 읽기 쉽고, 재미있는 책을 만났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으로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 분야 부동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내린 역사에 대한 정의다. 이 말대로 역사란 현재의 상황이나 개인의 입장에 따라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덧붙여 E.H.카는 과거와 미래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으며,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위치한 추상적 지점일 뿐이므로 ‘과거를 정확히 아는 것은 곧바로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주변이 긴장 상태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한반도도 이랬었다. 그리고 1910년 조선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됐다. ‘조선의 못난 개항’을 쓴 저자 문소영은 “조선의 개항이 1853년 미국 페리 함대에 의해 강제 개항됐던 일본보다 불과 23년 늦었을 뿐이었고, 개항 이후 한일병합 때까지 무려 34 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종 이하 어리버리 했던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그 때문에 이후의 세대들이 모든 고난의 짐을 떠안았다”고 성토한다.
‘나의 서양사 편력 1·2’를 쓴 역사학자 박상익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는 불변이나 그것을 보는 관점은 시대마다 변하는데 그 이유는 시대마다 문제 의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초적인 ‘먹고사니즘’을 핑계로 문제투성이의 현실에 너무 관심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 무관심에 경계 나팔을 불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고 한다.
1543년 유럽의 코페르니쿠스가 ‘천구의 회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것으로부터 200 년도 더 지나서야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거리만큼 우리는 서양(유럽)에 뒤져있었고, 지금도 여러 면에서 뒤져있다.
박상익 저자의 ‘거울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서양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한국 사회가 처한 좌표를 좀 더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때문에 서양사를 노크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보다 객관적, 입체적으로 직시하게 되는 길이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이 책 제목 중 ‘편력’의 편은 ‘편애하다’의 치우칠 편(偏)이 아니라 두루두루, 구석구석 살펴보았다는 두루 편(遍)이다. 람세스, 모세, 알렉산드로스의 고대에서 오바마 대통령, 냉탕과 온탕을 왕복하는 스위스 시계산업의 현대까지 3천 5백 년 유럽의 역사에서 분수령을 이룬 사건과 인물, 이슈94 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저자가 영국의 청교도 혁명가 존 밀턴을 연구해 박사가 된 만큼 밀턴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5 편이 더해졌다.
모두 99 편의 이야기들이 역사학자의 딱딱한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저자가 가지고 있는 동서남북, 상하좌우의 모든 지식과 입심을 녹여서 재미있게 풀어가는 산문 형식이다. 이 책을 읽는 재미가 보통이 아닌 이유다. 저자가 서문에서 ‘역사 읽기는 여행과 닮았다. 여행은 익숙한 공간을 떠나 낯선 풍광을 접할 기회를 주는 즐거운 경험이다. 역사 읽기는 시간 여행이다. 특히 서양사 읽기는 시간 여행인 동시에 공간 여행이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닌 것이다.
제 1권, 고대에서 근대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탄생해 대륙 별로 피부색깔이 달라지게 된 이유에서 시작한다. 고대의 영웅 알렉산드로스, 로마, 그 로마를 위협했던 한니발을 거쳐 중세로 넘어온다. 중세는 베네치아의 ‘날개 달린 사자’ 브랜드 마케팅, 1급 비밀 안경 제조술, 노블레스 오블레쥬의 상징 ‘칼레의 시민’들과 함께 근대 1부로 넘어간다. 근대 1부 첫 이야기는 ‘대담한 오류 덕분에 항로를 찾아 내다’인데 후추 1kg을 은 1kg으로 샀던 시대에 향료의 나라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엇박자를 그려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제 2권, 근대에서 현대까지는 근대 2부로 시작되는데 전체 중 50번 째 이야기이자 2권의 첫 이야기는 ‘원숭이로 조롱 받았던 다윈이 이긴 이유는 도덕성’이었다는 사연이다. ‘머리 위에는 별, 마음 속에는 도덕’으로 유명한 철학자 칸트를 거쳐 마지막 현대사 31 편의 이야기가 뒤따른다. 69번째 이야기 ‘영국 자유당의 사회개혁, 중산층 외면으로 흔들’에서 시작해 98번 째 이야기 ‘프랑스의 고령사회’와 마지막 99번 째 이야기 ‘스위스 시계산업의 흥망’에서 박상익 박사의 서양사 편력은 대단원의 끝을 맺는다.
북컬럼니스트 최보기 thebex@hanmail.net
'콘텐츠 > 전문필진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천항만공사 최보기의 책보기 04 - 류성룡, 7년의 전쟁 (6) | 2015.03.17 |
|---|---|
| 인천항 대학생 기자단 7기 간담회 현장을 가다! (12) | 2015.03.03 |
| [칼럼] 인천신항 조기 안착 응집력 모아야 (5) | 2015.02.26 |
| [문학작품으로 읽는 인천항 풍경]인천 축항(築港)과 박인환의 '인천항' (4) | 2015.02.05 |
| 인천항만공사 최보기의 책보기 02 - 장사는 과학이다 (4) | 201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