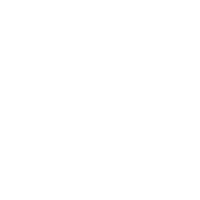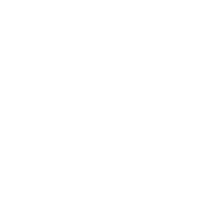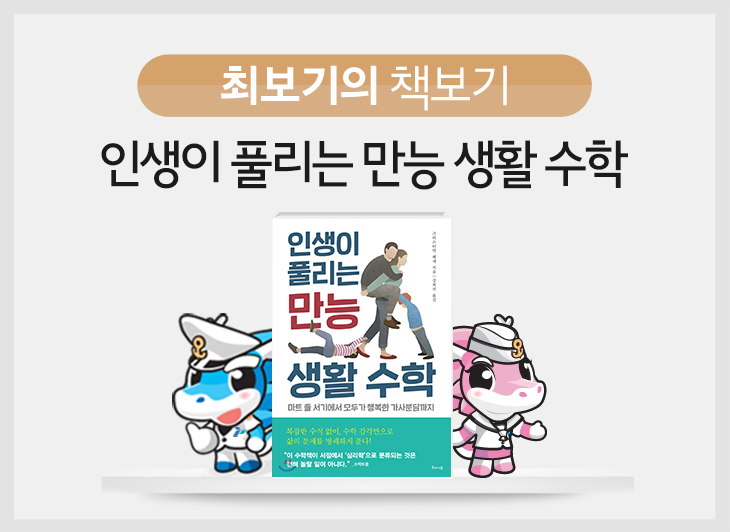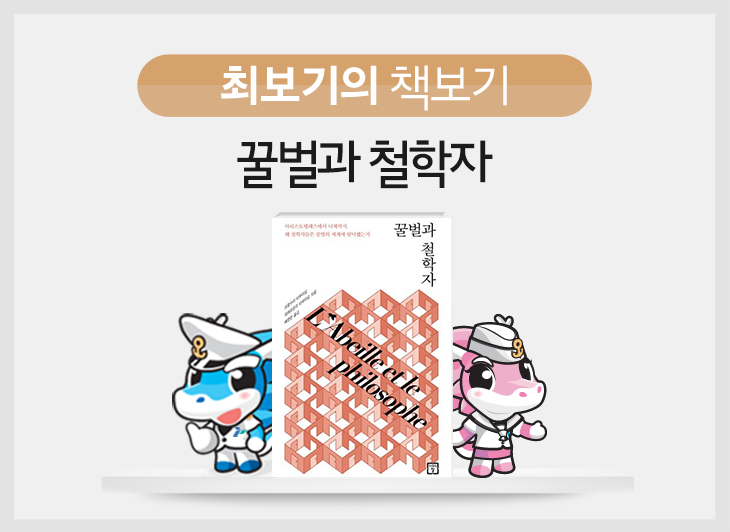
난세를 헤쳐나갈 꿀벌의 지혜

“꿀벌과 철학자” (프랑수아 타부아요 형제 지음, 미래의창 펴냄)
자연은 여전히 인간의 과학으로 풀지 못할 영역이 가득하다. 꿀벌과 개미, 거미의 집안은 과학이 명쾌하게 풀지 못하는 신비로 꽉 차있다. 신이 인간에게 보낸 선물이라 불리는 뉴튼도, 상대성원리를 발견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꿀벌의 집을 들여다 볼수록 과학의 일천함과 신(神)의 무한함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현존 지구상의 인류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초유의 대재앙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15 총선까지 겹쳤던, ‘잔인한 달 4월’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는 합리적 처리용량의 임계점을 이미 넘었거나 넘기 직전일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 없는 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으로 24시간 초긴장, 이미 예견된 경제적 대위기, 전에 없는 정치적 소음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머리는 지끈지끈 폭발할 지경이다. 잠시 스위치 아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저런 현실을 던져버리고 지혜를 담은 책 한 권에 빠지는 것도 이 위기를 극복할 영감을 얻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그로부터 4년 후 멸망할 것이다”는 충격적인 말은 아인슈타인이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거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 생태계의 붕괴를 막는 꿀벌의 막중한 역할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꿀벌의 세계는 인류문명이 탄생한 직후부터 인간들에게 우주질서의 비밀을 엿보게 하는 콘텐츠의 보고였다. 생물학부터 화학, 물리학, 수학, 건축학, 공학, 경제, 정치, 사회, 문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학자들이 우주와 신과 인간의 비밀을 캐는 영감을 얻기 위해 그 창고를 드나들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는 물론 군주정, 귀족정, 공화정, 민주정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들도 꿀벌의 세계를 탐구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꿀벌의 세계는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여왕벌의 식사인 로열젤리에 환호하고, 부패하지 않는 벌꿀의 신비에 놀란다. 꿀벌들이 부지런하다는 것, 그들이 꽃가루를 옮겨 식물들이 번성한다는 것 정도의 피상적 지식이 전부다. 사실 이것은 ‘꿀벌의 오묘한 세계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육각형 벌집의 건축술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으로 연구돼 휴대폰 기지국의 효율적 배치에 쓰인다는 것과 축구 골대의 그물망이 쉽게 찢어지지 않는 비밀에 응용됐다는 것, 멀리 있는 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벌들이 주고 받는 신비한 비행 신호, 꽃들과의 공존을 위한 상호 대화, 몸통보다 작은 날개를 가진 탓에 초당 230회의 날갯짓을 한다는 것까지 안다고 해도 그렇다.
그나마 과학자들이 꿀벌의 날갯짓 등 비행원리를 밝혀낸 것은 겨우 15년 전의 일이다. 슈퍼컴퓨터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일상적인 자연현상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 설계론’자들의 비아냥으로부터 과학자들은 체면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오묘한 꿀벌의 세계를 파면 팔수록 그가 누구든 설계자, 신(神)의 존재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수(Jesus)가 오기 전에 꿀은 신들의 양식이었고, 꿀벌은 신의 메신저로서 자연과 문명의 매개자였다. 예수로 인해 용도 폐기됐던 꿀벌은 예수 사후 100년이 안 돼 아우구스티누스 등 로마의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부활절의 양초(밀랍), 성모 마리아의 처녀성 입증, 수도사들의 설교를 위한 ‘순결, 복종, 엄격, 봉사’를 품은 콘텐츠의 보고로 다시 성소에 초대됐다. 세속의 통치자들에게는 훌륭한 정치참모로 복귀했다.
그러해왔던 꿀벌의 메커니즘은 2020년에도 여전히 민주주의 연구는 물론 구글(google)로 대변되는 신산업의 새로운 착취경제모델과 하늘을 혼자 나는 드론(drone)에 이르기까지 인류문명의 무한한 지적 원천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꿀벌과 철학자”를 쓴 저자들은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의 철학교수 동생과 양봉으로 생계를 잇는 형이 같이 쓴 책이다. 꿀벌로부터 인간이 배우고, 통찰해야 할 모든 지혜가 에덴동산에 흐르는 젖과 꿀처럼 넘치는 책이다.


'콘텐츠 > Togeth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보기의 책보기66_”인생이 풀리는 만능 생활 수학” (0) | 2020.05.19 |
|---|---|
| COVID-19 확산에 따른 크루즈 산업의 전망 (1) | 2020.04.29 |
| 물류·유통 스타트업의 현재와 미래 Ⅱ (0) | 2020.03.27 |
| [최보기의 책보기]64_"리스크의 과학" (0) | 2020.03.19 |
| 물류·유통 스타트업의 현재와 미래 (1) | 202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