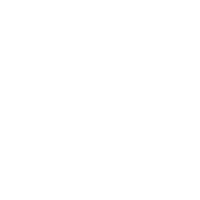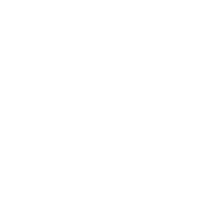레프 니꼴라에비치 똘스또이 지음 <이반 일리치의 죽음>
똘스또이, 도스토예프스키에서 솔제니친과 올해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나라 벨라루스는 구 소련에서 독립한 러시아 권 국가)까지 러시아 문학은 거대하다. 시베리아의 추위에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러시아 문학이 세계문학의 한 축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러시아의 문학가들 중에 대문호를 말하라면 누구나 똘스또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똘스또이는 <안나 카레리나>, <전쟁과 평화>, <부활> 등 엄청난 장편의 소설을 썼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죄와 벌>, <백치> 등이 있다.
전 세계 소설가들을 대상으로 ‘첫 문장이 가장 인상적인 소설’을 조사한 결과 <안나 카레리나>가 뽑혔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파다하다. <안나 카레리나>는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불행의 이유가 다르다.’로 첫 문장이 시작된다. 대문호답게 똘스또이의 소설들은 어마어마한 장편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의 유명세에 비해 그의 작품을 하나라도 완독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나’만 똘스또이를 읽지 않은 게 아니니 그걸로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똘스또이의 작품을 단 하나도 읽지 않고서야 어디 가서 똘스또이를 말한다는 것은 낯간지러운 일일 수 있다. 그걸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외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중, 단편 소설도 꽤 있으므로 그 작품들을 읽으면 똘스또이의 맛은 보게 되는 것이다.
시중에 많이 출판되어 있는 <똘스또이(또는 톨스토이) 단편선>은 꾸준한 스테디셀러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보 이반’, ‘두 노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등의 단편소설들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른 주옥 같은 작품들이다.
그리고 단편과 중편 사이쯤의 소설로 국내에도 단행본으로 번역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있다. 이 작품은 ‘1800년대 똘스또이의 문학적 성과를 대변하는 수작’이라고 평가 받을 만큼 똘스또이 문학의 진수이다. 몇몇 단편들과 함께 그리 길지 않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는 것으로도 톨스토이라는 대문호의 세계를 생각보다 깊이 엿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소설이 <변신>, <이방인>과 함께 3종 세트로 함께 읽으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는 것이 이번 호의 추천 이유가 되겠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1886년에 발표되었다. 약 30년 후인 1915년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 그로부터 또 약 30년 후인 1942년에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이 발표되었다. 뒤의 두 소설 역시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작이자 화제작’들이다.
그런데 이 세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반 일리치, 그레고르 잠자, 뫼르소’ 등 주인공들의 ‘소외와 외로운 죽음’을 주제로 다룬다는 것이다. 이 소설들을 함께 읽으면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혼자일 수 밖에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은 온전히 자기 혼자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거짓과 위선과 이기심 가득한 인간세계의 냉혹한 실상’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성찰해 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세 소설 모두 매우 길지 않은 중단편이라는 것도 독자들의 부담을 덜게 한다.
이반 일리치는 러시아 제정 시절 누구보다 잘 나가던 엘리트 판사였으나 어느 날 문득 옆구리의 통증을 느꼈고, 그로부터 긴 투병이 시작된다. 의술이 발달한 지금과 달리 엑스레이 촬영이나 개복수술이 불가했던 시절이라 계속되는 뱃속의 통증을 치료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소설을 읽다 보면 독자 역시 이반 일리치의 병이 궁금해지는데 지금의 의학상식으로 추측하건 데 그의 병은 뱃속 장기 중 하나의 만성염증이거나 심할 경우 위암 같은 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가벼운 통증에서 점점 병이 깊어지면서 끝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아내와 딸, 아들 그리고 주변의 가까웠던 동료나 지인들이 보이는 ‘너무나 인간적인 행태’는 19세기 후반이나 21세기 초반이나 그리 다를 것 없는 ‘인간의 영원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암과 같은 병에 걸린 환자들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부정-분노-체념-달관’ 순으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반 일리치에게도 거의 맞게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병에 분노하고, 가족들 특히 아내에게 분노한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혼란스럽고 힘든 심리의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임종 직전 이반 일리치는 분노의 대상들, 특히 자신의 삶과 가족들을 용서하기에 이른다. 그 순간 그를 그토록 괴롭히던 통증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대신 환한 빛이 쏟아진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라는 달관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반 일리치가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으로 마음 속에 되뇌었던 ‘끝난 건 죽음이야.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가 영락없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반일리치가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 빛과 함께 죽음을 맞게 된 그 시점은 바로 위선과 거짓 투성이라며 증오하던 아내에게 “당신 불쌍해. 쁘로뿌스찌(보내줘)”라고 말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반일리치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말은 “쁘로스찌(용서해줘)”였다. 그 말을 바꿀 힘도 없던 그는 그러나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만다.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정한 사랑은 굳이 고쳐 말하지 않아도 ‘이신전심’이라는 가르침으로 이해가 된다.
북컬럼니스트 최보기 thebex@hanmail.net
'콘텐츠 > Togeth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천항만공사 최보기의 책보기 12 -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9) | 2015.11.24 |
|---|---|
| [칼럼] 세계 첨단 컨테이너 터미널과의 격차 해소해야 (8) | 2015.10.30 |
| [칼럼] 중국경제의 향방과 향후 건화물선 해운경기 (5) | 2015.09.30 |
| 인천항만공사 최보기의 책보기 10 - 허삼관 매혈기 (6) | 2015.09.25 |
| [칼럼] 초대형선 시대 항만과 선사 투자 윈윈전략 세워야 (6) | 201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