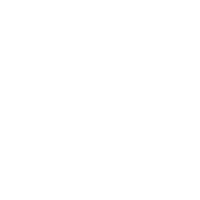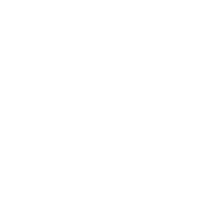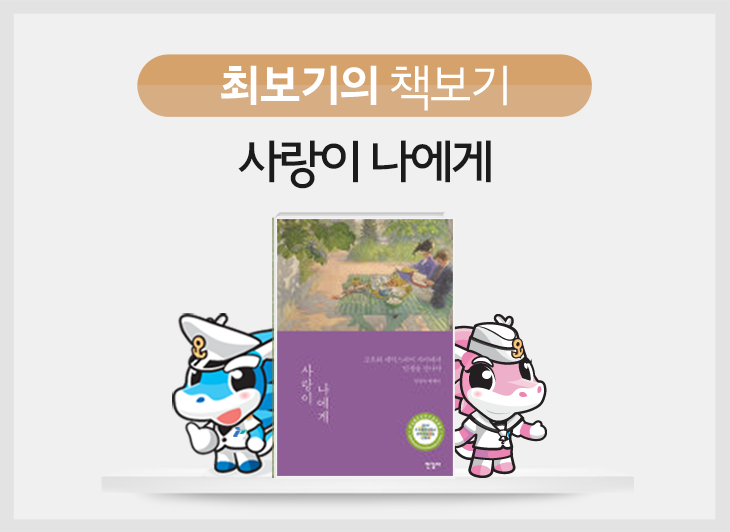철학은 지식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
“미치게 친절한 철학” (안상헌 지음, 행성B 펴냄)
이런 유머가 있다. 1970년대 어느 시골마을에 유사이래 천재가 나서 유명한 대학교 철학과에 합격을 했다. 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마을잔치를 열었다. 마을 어르신 중 평소 좀 유식한 체하시던 분께서 무슨 과에 합격했는지 물으셨다. 아들이 뒷머리를 긁으며 철학과라고 답하자 어르신께서 “그것 참 경사일세. 이제 우리나라도 포항제철이 생겼으니 쇠를 잘 다뤄야 잘살게 된다네”라며 손바닥을 치셨다고 한다.
철학(哲學)의 철(哲)은 ‘도리(道理)에 밝을 철(哲)’이다. 이는 철학이 ‘도리가 밝고 언동이 지혜롭고 총명한 학문’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철학자는 ‘도리가 밝고 언동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에 얽힌 유머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철학을 막연히 어려운 학문 또는 취업 등 현실에서는 그다지 쓸 데 없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이유에서다.
국어사전의 철학에 대한 정의를 보면 ‘철학 : 1.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 따위를 탐구하는 학문 2.자기 자신의 경험 등에서 얻어진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라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서 신념을 정하는 것이 철학’ 정도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 거야’라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면 그는 이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어렵고 골치 아픈 것으로 생각할까? 학교 다닐 때 시험점수를 위해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철학을 접했기 때문이다.
철학의 범주가 방대하다 보니 외국의 어떤 사전에는 ‘철학 :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학문’이라 정의했다는 설도 있고, ‘남들도 다 아는 것을 자기 혼자만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이 철학자’란 개그도 있다. 그렇지만 간혹 “당신은 대체 철학이 있어? 없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왠지 철학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가끔은 사람이 스스로의 성숙과 유식한 대화를 위해 철학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 철학을 매우 친절하고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 지금까지 그런 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책은 읽지 않으면서 철학은 어렵다고 말을 할 뿐이다.
‘서양철학사’ 전반을 설명하는 안상헌의 <미치게 친절한 철학>도 그런 책 중 하나다. 누군가가 “당신은 인생철학이 뭡니까?”라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대답이 분명한 사람은 연속되는 인생역정의 판단과 선택도 분명하다. “당신은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이고 그 창조물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철학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는 것, 어제와 다른 오늘, 과거와 다른 현재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창조의 희열을 맛볼 수 있고 그때 삶의 가능성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은 그 창조에 복무하는 것이고 마땅히 그러해야만 합니다. 철학은 지식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미치게 친절한 철학>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현대까지, 헤라클레이토스와 플라톤부터 니체와 마르크스를 거쳐 푸코와 들뢰즈까지 섭렵한다. 그의 철학 설명에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나 톨스토이의 명불허전 중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 책의 선전문구는 ‘철학책 한 권 끝까지 읽어 봤니?’이다. 끝까지 읽어볼 만하다는 저자와 출판사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왔다. 가을은 책 읽기에도 가장 좋은 독서의 계절이다.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이번 가을에는 정신을 성숙시키고 인생관을 확립해 행동하는 나를 재창조하도록 철학책 한 권 끝까지 읽어보길 권장한다.
'콘텐츠 > Togeth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칼럼]국제 물류 포워딩과 인천항만의 중요성 (2) | 2019.11.20 |
|---|---|
| [최보기의 책보기] 59-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0) | 2019.10.17 |
| [칼럼] 풍류가 느껴지는 인천 도서권 낚시 나들이 (7) | 2019.09.16 |
| [최보기의 책보기] 57-사랑이 나에게 (0) | 2019.08.31 |
| [칼럼] 낚시의 구분과 인구수, 지리적 위치로 본 인천의 매력 (0) | 2019.07.31 |